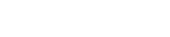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5-09-24 17:58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42.yadongkorea.icu
21회 연결
http://42.yadongkorea.icu
21회 연결
-
 http://60.yadongkorea.click
20회 연결
http://60.yadongkorea.click
20회 연결
본문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다. 원자력계가 한국 원자력 50주년(2008년)을 기념해 2007년 펴낸 두 보고서(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50년의 전개 과정 고찰’, 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우리나라 원자력 초창기의 전개 과정 고찰’)와 2006~2007년 4차례 진행한 원자력 원로 포럼 증언을 들춰본 느낌으로는,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원자력에 꽂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3월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했다. 그해 8월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제회의(스위스 제네바)’에 3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세계 최빈국이 국제 원자력 회의에 대표단을 보낸 것부터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소련, 영국, 미무료황금성게임
국에서 최초 원전을 완공하면서 원자력 붐이 일던 시기였다. 한국의 젊은 과학도 15명도 미군 장교가 건네준 ‘원자력공학 입문’ 교재를 타이프로 친 후 등사기로 복사해 토요 스터디그룹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4월 스터디그룹의 두 명을 시작으로 1959년까지 24명을 미국 아르곤연구소의 국제원자력학교(ISNSE) 연수주식투자상담
생으로 파견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쳐 1956~64년 총 234명이 미국, 영국 등에 원자력 해외 연수차 출국했다. 미국과 국제기구의 도움도 받았지만 예산을 쪼개 쓴 국비 파견생도 127명에 달했다. 이때 키운 인재들이 한국 원자력 부흥의 기둥이 됐다.
당시 내각에는 ‘원자력 5부(외무 국방 재무 부흥 문교) 장관 회의’라는 의사 결정신종플루테마주
시스템이 있었다. 그 추진력으로 원자력법 공포(1958년 3월), 원자력원(院) 설립(59년 1월), 원자력연구소 개소(59년 3월) , 연구용 원자로 기공(59년 7월) 등을 이뤄냈다. 원자력원 원장은 장관급, 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차관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 뜻을 못 이뤘다고 한다. 당시 정부 내 1급 태마주식
이상 공무원이 장·차관까지 40명 정도였는데 원자력 분야 1급 이상이 8명이나 됐다(원자력과장을 지낸 윤세원의 원로 포럼 증언).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봉급은 일반 공무원의 3배였다. 정부의 파격적 원자력 진흥에 호응해 1958년엔 한양대에, 59년엔 서울대에 원자력공학과가 신설됐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원자로 등 핵심 기자재까지 수출하게 된코리아에스이 주식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집념이 거둔 결실이다.
1956년 7월 8일 이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 전력 회사 사장 워커 시슬러가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시슬러는 “원자력은 사람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이니 한국 같은 자원 빈국은 원자력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시슬러는 “20년이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81세, 자기가 원자력 개척의 열매를 딸 수는 없는 나이였다. 그때부터 20년 하고 2년이 더 지난 1978년 7월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준공됐다. 이승만이 씨앗을 뿌렸고 거기에 박정희가 물을 줘서 열매를 맺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소비를 100이라고 치면 태양광·풍력이 10, 원자력이 30을 만들고 나머지 60을 석탄·가스발전소가 공급한다.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전력 생산량을 250까지 늘려가야 한다. 이걸 대부분 태양광·풍력과 원자력의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태양광·풍력의 10과 원자력의 30, 도합 40을 200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원자력을 배제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금 10인 태양광·풍력만 갖고 200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나? ‘무탄소 전력 총동원’ 체제로 가야 한다. 태양광·풍력도 최대한 짓고 원자력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늘려가야 탄소 중립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지금 시작해야 10년이 지나도 될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놨으니 어느 장관, 어느 공무원이 그걸 추진하겠나. 70년 전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20년 먼 미래를 겨냥해 원자력 중흥의 발판을 놓기 시작했다. 70년 후 대통령은 임기 내 열매를 못 딴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10년, 15년은 너무 멀다’며 원전 신규 건설에 회의적이다. 대한민국이 10년, 15년만 존속하고 마는 건 아니다.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미래를 그르치고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매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5개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분 칼럼' 더보기(https://www.chosun.com/tag/5mins-column/)
이승만 정부는 1956년 3월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했다. 그해 8월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제회의(스위스 제네바)’에 3명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세계 최빈국이 국제 원자력 회의에 대표단을 보낸 것부터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소련, 영국, 미무료황금성게임
국에서 최초 원전을 완공하면서 원자력 붐이 일던 시기였다. 한국의 젊은 과학도 15명도 미군 장교가 건네준 ‘원자력공학 입문’ 교재를 타이프로 친 후 등사기로 복사해 토요 스터디그룹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4월 스터디그룹의 두 명을 시작으로 1959년까지 24명을 미국 아르곤연구소의 국제원자력학교(ISNSE) 연수주식투자상담
생으로 파견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쳐 1956~64년 총 234명이 미국, 영국 등에 원자력 해외 연수차 출국했다. 미국과 국제기구의 도움도 받았지만 예산을 쪼개 쓴 국비 파견생도 127명에 달했다. 이때 키운 인재들이 한국 원자력 부흥의 기둥이 됐다.
당시 내각에는 ‘원자력 5부(외무 국방 재무 부흥 문교) 장관 회의’라는 의사 결정신종플루테마주
시스템이 있었다. 그 추진력으로 원자력법 공포(1958년 3월), 원자력원(院) 설립(59년 1월), 원자력연구소 개소(59년 3월) , 연구용 원자로 기공(59년 7월) 등을 이뤄냈다. 원자력원 원장은 장관급, 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차관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 뜻을 못 이뤘다고 한다. 당시 정부 내 1급 태마주식
이상 공무원이 장·차관까지 40명 정도였는데 원자력 분야 1급 이상이 8명이나 됐다(원자력과장을 지낸 윤세원의 원로 포럼 증언).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봉급은 일반 공무원의 3배였다. 정부의 파격적 원자력 진흥에 호응해 1958년엔 한양대에, 59년엔 서울대에 원자력공학과가 신설됐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원자로 등 핵심 기자재까지 수출하게 된코리아에스이 주식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집념이 거둔 결실이다.
1956년 7월 8일 이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 전력 회사 사장 워커 시슬러가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시슬러는 “원자력은 사람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이니 한국 같은 자원 빈국은 원자력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자 시슬러는 “20년이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81세, 자기가 원자력 개척의 열매를 딸 수는 없는 나이였다. 그때부터 20년 하고 2년이 더 지난 1978년 7월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준공됐다. 이승만이 씨앗을 뿌렸고 거기에 박정희가 물을 줘서 열매를 맺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소비를 100이라고 치면 태양광·풍력이 10, 원자력이 30을 만들고 나머지 60을 석탄·가스발전소가 공급한다.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전력 생산량을 250까지 늘려가야 한다. 이걸 대부분 태양광·풍력과 원자력의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태양광·풍력의 10과 원자력의 30, 도합 40을 200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원자력을 배제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지금 10인 태양광·풍력만 갖고 200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나? ‘무탄소 전력 총동원’ 체제로 가야 한다. 태양광·풍력도 최대한 짓고 원자력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늘려가야 탄소 중립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지금 시작해야 10년이 지나도 될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놨으니 어느 장관, 어느 공무원이 그걸 추진하겠나. 70년 전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은 20년 먼 미래를 겨냥해 원자력 중흥의 발판을 놓기 시작했다. 70년 후 대통령은 임기 내 열매를 못 딴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10년, 15년은 너무 멀다’며 원전 신규 건설에 회의적이다. 대한민국이 10년, 15년만 존속하고 마는 건 아니다.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미래를 그르치고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매일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5개가 담긴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분 칼럼' 더보기(https://www.chosun.com/tag/5mins-colum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